우연찮게도 며칠 전, '이리'를 다녀왔다.
정확하게는 '익산'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이리'라고 쓴다. 읽을 때는 '익산'이라고 읽을지도 모르겠다. 이리라고 쓰고, 익산이라고 읽는다? 며칠 후, 내가 <이리>를 볼 것이라곤 생각지도 않았다. 아니 못했다.
애초 이 영화는 연작(<중경>과 함께)이라고 진즉에 알고 있었다.지난해 개봉 당시 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실행의 부재로 결국 접하지 못했던 터. 두 편 모두.
내가 발 디뎠던 이리는, 단편적인 인상만 말하라면, 죽어있는 소도시 같았다. 신시가지라고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으나,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서울을 동경하는 듯한 그 뉘앙스는 불편했다. 신시가지의 그 볼품없는 간판들이 사람들의 미적 감수성을 해치긴
마찬가지고. 서울을 욕망하는, 획일화되려는 풍경. 이방인이라서 그랬겠지만, 과연 이리(에 삶의 터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리> 상영 전, 조영각 서독제 집행위원장이 영화와 감독에 대한 소개를 했다.
모르겠다. <이리>를 보면서 지금 시대의 알레고리 같다고 생각한 것은 왜였을까. 30년 전 이리역 폭발사고를 소재로 했다는 영화. 30년 후 이리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도 상처를 치유하진 못했다. 이리역 폭발에 따른 상흔이 30년 후에도 지속되는 건, 아마 30년 전과 다르지 않은 시대적 징후 때문일지도. 박정희와 이명박. 물론, 그것은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은 당대의 시대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니까.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뜻이지.
내 기억이 맞다면, 극 중 태웅(엄태웅)은 한 번도 웃지 않는다. 정신줄을 약간 놓고 사는 누이, 진서(윤진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못 받아도, 윤간을 당해도 별다른 저항도 없고 덤덤하다. 물론 그것이 그의 마음까지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태웅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가끔 화를 내고 패대기를 치지만, 그것 뿐이다. 근본적인 치유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가끔 진서가 삶의 큰 짐처럼 느껴지는지 죽이고 싶은 충동을 드러낸다.
롱테이크는 길고, 인물들의 감정을 끌고 가야하는 것이, 참으로 무겁다. 신산하기 그지없는 삶의 풍경 앞에 관객인 나는 견뎌내야 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싫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감독이 우리에게 건네는 속삭임 같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딜 것. 내 안의 이명박에게
휘둘리지 말 것. 이명박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이명박을 닮은 우리들에게 건네는 토닥거림.

익산이 아닌 이리여야 하는 이유.
내가 이리라고 쓰고 싶었던 이유.
당신은 알겠지?
아 참, 김동원 감독님과 한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봐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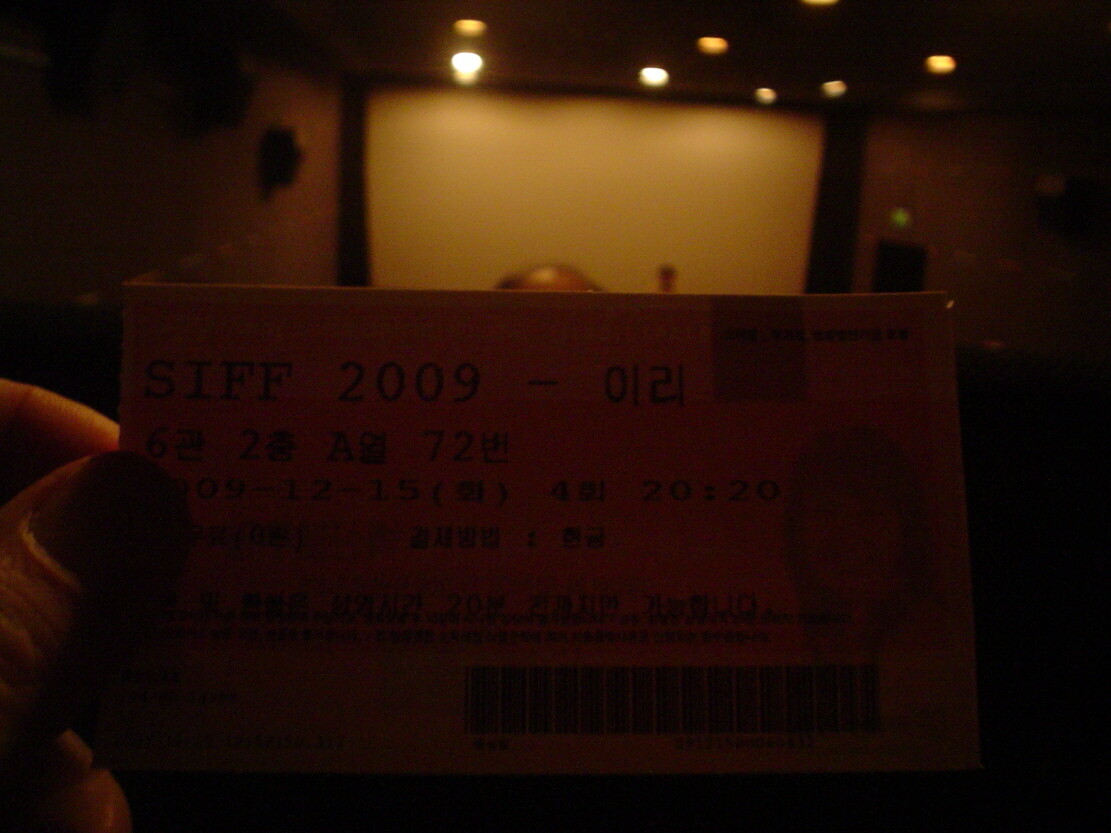
'메종드 쭌 > 무비일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기만 아니라면, 어딘가에... (0) | 2009.12.18 |
|---|---|
| 서독제가 있는 풍경 (0) | 2009.12.17 |
| 하늘 아래 새로운 영화가 있다? (0) | 2009.12.14 |
| 내가 아직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이유 (2) | 2009.12.13 |
| 그 원 나잇 스탠드, 짜릿했냐고? (0) | 2009.12.13 |

